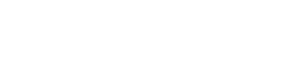“나에게 아픈 것은 아무것도 아녜요. 지금 하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주도 성산 일출봉 근처에 있는 조그만 폐교에 사진갤러리를 만들고 마당에 정원을 꾸미는 일을 하고 있던 사진가 김영갑. 근육이 장작처럼 굳어가고 오그라드는 병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 말했다.
그가 먹을 것이 없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필름과 인화지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하루도 쉬지 않고 찍은 제주를 제주도청 전시실에서 보여 주었다. 1999년이었다. 전시회 오픈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려 했는데 갑자기 호흡이 힘들어지고, 목소리가 나지 않았다. 숨이 차고, 허리가 끊어질 듯 하프면서 뒷목이 당겼으며, 손은 떨리고 다리가 마비되기 시작했다. 그의 인생에 처음 겪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병이었다. 서울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루게릭병이라면서 불치병이라고 했다. 날이 가면서 병은 더욱 심해졌고, 영혼 속에 갇혀 죽을 때만 기다리는듯했으나 정신만은 또렷했다. 2년여 동안 치료를 위해 헤맸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할 수 없이 아픔을 끌어안고 살겠다고 결심했다.
그즈음 그의 사진사랑, 카메라 사랑에 감동한 주민들이 마련해준 돈으로 남제군 성산읍 삼달리에 있는 폐교에 갤러리를 만들었다. 두모악갤러리, 김영갑 사진갤러리다. 더 사진을 찍을 수 없으니, 그동안 찍어놓은 사진을 세상 사람들에게 실컷 보여 주고 싶었다.
술 좋아하는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난 그의 고향은 충남이다. 그가 청년이 되어갈 무렵 형제들이 대학에 갈 것을 권했으나 정반대의 길을 향했다. 평범한 사회인이 되는 것을 거부한 그는 목사가 운영하는 곳에서 맹인들과 지냈다. 세상에서 소외된 맹인들과 생활하는 것 또한 즐거웠다.
서울을 떠나 제주로 갔다. 월남전에 갔다 돌아온 형이 사준 카메라로 한라산 중산간 오름과 때묻지 않은 섬을 필름에 담았다.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이 무렵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마저 갑자기 세상을 뜨셨다.
“너 장가가면 네 각시에게 직접 줄 거야”라며 갖고 계셨던 어머니의 예쁜 삼지를 보여 주시며 지극히도 그를 위해 주셨던 어머니와 제주에서 홀로 살고 있어 불쌍하다면서 무엇이든 도와주려고 애쓰셨던 아버지셨다. 태어나서 처음 사랑했던 이성, 그녀도 마음이나마 항상 그의 주변에 있었다.
사진에 대한 애착은 식기는커녕 알토란같이 여물어갔다. 없는 돈에 얻은 작은 방, 끼니는 고사하고 허기를 채우기도 어려웠지만, 그에겐 또 다른 즐거움이었다. 숫기는 없었지만 알량한 자존심만 강했던 그는 냉수 한 사발로 식사를 대신하면서도 카메라를 들고 제주 곳곳을 찍을 때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눈에 보이는 산을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산이 나타나는 고난이지만 난 그 모든 것을 내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즐겨요.”
그의 눈을 흐리게 하는 그 무엇도, 귀를 먹게 하는 소리도, 코를 막히게 하는 냄새도 제주의 자연이 자리한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며, 잡을 수 없는 환상이 숨겨 있는 제주의 자연은 최고였다.
그의 머리에는 항상 미국 서부의 모든 것을 사진으로 이루어낸 사진가 안셀 애덤스가 있다. 불굴의 투지의 사진가 안셀 애덤스처럼 해내리라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라면박스 수십 개에 담긴 필름이 그의 제주사랑을, 그의 연인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2005년 그의 나이 마흔여덟에 세상을 떴지만 지금도 김영갑사진갤러리 두모악에 그의 사진들이 계속 교체전시되고 있다. 김영갑이 한 이야기 한 구절이 있다. “카메라는 내 삶의 옹달샘입니다. 옹달샘은 인적 드문 안골 숲 깊은 속에 있지만 목마름을 풀어주는 생명수이니, 옹달샘은 아주 소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