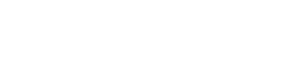지난번 칼럼 `페달을 밟다'에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하릴없이 놀고 있는 자전거라고 해서 아예 돈이 들어가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타이어의 바람이 죄다 빠져 있어서 걱정이 커질 때면, 자전거 대리점에 가서 진단과 처방을 받았던 겁니다.
빠진 바람을 다시 불어넣고 하는 것으로는 모자라서 타이어를 새것으로 바꾼 적도 있고, 브레이크를 손보기도 했고, 잠금장치를 바꾸고 야간 주행용 플래시를 사기도 했죠.
무작정 놀리고만 있기엔 유지비용만 아깝다는 생각을 물리칠 수 없다가, 별일 없는 토요일 아침만이라도 자전거를 타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바구니 자전거를 탄다고 해서 복장을 아무렇게나 할 순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지나치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만 아니면 되겠다 싶었죠.
날렵하게 생긴 선글라스에다가 손가락이 드러나는 장갑을 착용했고, 목에는 손수건을 둘렀습니다. 손수건은 몇몇 관광지에서 구입했던 것들로 유명무실했던 겁니다. 머리카락이 눌리는 것을 싫어해서 모자는 쓰지 않았고, 윗옷과 아래옷의 배색은 어긋나지 않도록 신경을 썼지요.
익숙해진 코스를 따라 페달을 밟으면서 본 것들에 대해 말하고도 싶습니다.
여러 꽃을 보았습니다. 개망초, 무궁화, 목백일홍, 나팔꽃, 공작초, 그리고 달맞이꽃 등을 보았습니다. 노란 달맞이꽃은 아직 달이 뜨지 않은 이른 시간에도 꼼작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참새처럼 작은 새 한 마리가 나무 기둥 옆에 비스듬히 달라붙어 있기도 했고, 실개천에선 물고기들이 펄쩍 뛰어올라 비늘이 반짝거린 적도 있습니다.
지나치는 사람들의 모습도 틈틈이 보았습니다. 누구는 땀을 배출하는 옷을 입고 빠르게 걸었고, 누구는 유모차에 아기를 데리고 나왔고, 누구는 벤치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만졌고, 또 누구는 어느 한 곳에 시선을 둔 채 멍을 때렸죠.
페달을 밟으며 한껏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한 때도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주변 차량들의 상황을 의식했고, 반대편에서 자전거가 올 때는 속도를 줄이면서 길의 공간을 쟀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다가 샛길로 빠질 때 들렀던 커피집 주인장은 여행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읽은 책들을 매장 곳곳에 꽂아두었습니다. 어느 날엔가는 두 권의 책이 말을 걸더군요. 독일 사람 파트리크 쥐스킨트(Patrick Suskind)가 쓴 `깊이에의 강요'와 프랑스 사람 피에르 쌍소(Pierre Sansot)가 쓴 `느리게 사는 것의 의미'였어요.
그래요. 실개천은 제게 바다처럼 깊어지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과속하지 않아야만 피할 수도 있습니다.
페달을 밟다가 자전거 안장에서 궁둥이를 떼야 할 때도 있더군요. 가파른 오르막길을 만나게 되는 숨 가쁜 순간이었습니다.
/에세이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