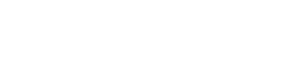이번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는 국민 모두에게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었다. 2022년 서울의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밤새 뉴스 속보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한 이들이 부지기수였고, 이어서 들려오는 희생자 가족의 애끓는 사연에 슬퍼하고, 무방비한 정부의 조치에 분노하면서 그렇게 국가가 정한 애도기간이 지나갔다. 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속에 슬픔과 분노는 30일 새벽 소식을 들은 그 순간 그대로 생생하게 남아있다. 이런 상황은 우리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한국 현대사 속에 몇몇 사건들이 선명하게 떠오르지만, 그때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트라우마를 겪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을 딛고 슬픔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많은 시간과 고통이 따랐었다.
이런 비극적 사건은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다. 과거에는 전쟁, 자연재해, 기아, 질병 등의 이유로 다수의 죽음이 더 자주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회는 공동체 차원에서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남은 이들을 위로하며 이 죽음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는 여제(_祭), 수륙제(水陸齋)와 같은 죽음의례의 형태로 구현되었다. 여제(_祭)는 조선시대 불행한 죽음을 맞거나 제사를 받지 못하는 망자들을 위해 국가가 주관하여 지냈던 제사로, 예조에서 사관(祀官)을 파견하여 매년 2회(7월 15일, 10월 15일) 북교(北郊)에 있는 여단(_壇)에서 제사를 지냈다. 수륙제(水陸齋)는 불교에서 물과 육지를 헤매는 영혼과 아귀(餓鬼)를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불교의식이다. 고려시대부터 조선 중종 때까지는 국가 주도로 시행되었으나, 중종 때 유생들의 반대로 국가주도 의례는 사라지고, 민간 중심으로 전승되었다. 이렇게 이어진 전통은 진관사 수륙재, 아랫녘 수륙재, 삼화사 수륙재 등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그 명맥을 잇고 있다.
종교학자 정진홍은 죽음의례란 그것이 상(喪)이든 장(葬)이든 제(祭)든 죽음을 수용하고, 주검을 추스르고, 죽음을 마음에 담는 일련의 몸짓이라고 하였다. 또한 존재하는 어떤 현실을 의미있는 어떤 것으로 승인하는 절차이며, 죽음 사건를 겪는 개인 및 공동체, 그리고 그 문화 자체가 죽음의 의미를 축조하는 틀이라고도 하였다. 이처럼 죽음의례는 우리 역사와 맥을 같이하며 우리문화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현대화되면서 죽음의례의 양상도 변화하였다. 종교학자 이용범은 인구의 도시집중, 핵가족화, 지역공동체의 해체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죽음의례의 주체가 변했다고 보았다. 이전 한국사회에서 죽음은 당사자와 그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는 다수의 죽음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죽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한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이 속해있는 마을과 같은 지역공동체 전체의 일로, 초상이 발생하면 마을 사람들은 다른 일을 멈추고, 상가 집에 가서 여성은 음식과 수의를 준비하고, 남자들은 부고, 호상, 일체의 상여물품 준비, 상여매기 등으로 역할을 나눠 장례의 모든 것을 도와준다. 이렇게 장례의 전 과정을 마을 사람들이 함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장례공간이 거주했던 집이 아닌 병원이나 장례식장이 되면서 상장례의 진행 역시 전문 장의업자의 일이 되었고, 망자의 가족과 지역 주민들은 수동적인 참여자에 그치게 되었다고 하였다.
죽음의례에 대한 연구논문들을 찾아보면서 필자는 이런 생각을 했다. 지난 일주일 우리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족들의 슬픔에 공감했지만, 어쩌면 수동적 참여자로서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기만 한 것은 아닐까? ‘우리’의 일이지만 어쩌면 ‘나’의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조금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국가가 정한 애도기간은 지났지만, 우리가 이 비극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하기 위한 기간은 이제 시작이다. 국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희생자분들을 추모하고, 유족들과 슬픔을 함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지하고 조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비극을 오롯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