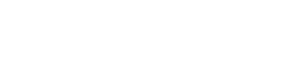`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라는 대중가요가 있었습니다. 가수이자 목사인 윤항기가 1980년에 발표한 곡인데 노랫말이 좋아 민초들이 흥겹게 불렸던 노래입니다. 거리에 최루탄이 난무하던 전두환 정권 집권기에 히트한 곡이어서 아이러니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진학을 포기한 채 말단공직에 청춘을 의탁한 저에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 신기루 같은 노래였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를 흥얼거리면 말단의 고단함과 타향살이의 외로움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행복해서가 아니라 행복해지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랬던 그 노래를 고희를 넘긴 나이에 다시 읊조립니다. 행복에 겨워서 부르고, 남은 생도 그러고 싶어서 부르고 또 부릅니다. 주책이라고, 노망이라고 힐난해도 좋습니다. 정말이지 요즘 정말 정말 행복하니까요. 딱히 좋은 일이 있어서도 아니고, 건강도 살림살이도 나아진 게 별반 없는데도 그러니 요상합니다. 운동하다 무릎연골이 찢어져 거동도 불편하고 협심증과 협착증에 전립선까지 좋지 않아 삶의 질이 나락으로 떨어졌는데도 불행하기는커녕 행복하기만 하니 야릇하고 신묘합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별게 아니었습니다. 기대하고 경쟁하던 삶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바뀐 게 주된 요인이었고 내 안과 내 곁에 있는 소소한 흔들림과 일상들을 벗하고 살아서였습니다.
스스로 불행타 여기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행복하다 여기지도 않았던 지난날이었습니다. 출세욕과 명예욕을 채우려다 심신에 많은 생채기를 냈고, 부주의한 말과 행위로 본의 아니게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으니 회한이 없을 리 만무합니다.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은데 가난해서, 키가 작아서, 학연·지연·혈연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시운이 따르지 않아서 라고 원망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했으니 온전할 리 없습니다.
무지개를 잡으면, 파랑새를 찾으면 행복할 줄 알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무지개와 파랑새 잡이로 보냈는데 손에 쥔 건 허망과 허무였습니다. 그렇다고 헛된 건만은 아니었습니다. 내려놓으면 가벼워진다는 걸, 비우면 채워진다는 걸, 자족하면 행복해진다는 걸 알았으니 말입니다. 편히 쉴 집이 있고, 끼니 걱정 없고, 착한 아내 맞아 두 아들 잘 키워 성가시키고 손주 재롱까지 보고 사니 괜찮은 인생이라 여깁니다. 거기에 공직과 강의와 집필에서 축적된 내공까지 곁들어 있으니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또 탁구 칠 동호인들과 골프 칠 동호인들이 주변에 있어 탁구치고 싶으면 탁구치고 골프치고 싶으면 골프를 즐길 수 있으니 좋습니다.
무릎연골이 찢어져 고통스럽기는 하나 그 덕분에 맨발걷기를 하는 행운을 얻었고, 맨발걷기와 접지를 꾸준히 해 건강도 좋아지고 환우들과 교우하면서 진지함과 절심함도 깨우치고 있으니 이 또한 축복입니다. 딱히 미운 사람도 없고, 내쳐야 할 사람도 없으니 홀가분합니다. 잇속을 위해 남을 짓밟을 일이 없어 좋고, 이런저런 아쉬운 소리할 것 없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호·불이 있는 건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니 눈과 귀도 편합니다.
문득 행복해지려면 욕망을 줄이든지 소유물을 늘이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 뇌리를 스칩니다.
세 잎 클로버는 `행복'이고, 네 잎 클로버의 `행운'이란 꽃말도 떠오릅니다. 비범 속에 행복이 거하는 게 아니라 평범 속에 행복이 거함을 웅변합니다.
그렇습니다. 욕망을 줄이고 세 잎 클로버로 사니 이래저래 행복합니다.
하여 오늘도 노래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세 잎 클로버인 그대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부디.
/시인·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