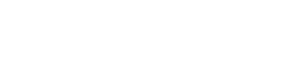춥고 긴 겨울을 지나다 보면 봄이 빨리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봄이 오고 나면 그것을 눈치 채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무슨 일에 골몰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무덤덤해서 그렇기도 하다.
송(宋)의 시인 주희(朱熹)도 봄이 온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봄을 맞이한 사람 중 하나였다.
봄날(春日)
勝日尋芳泗水濱(승일심방사수빈) 화창한 날에 꽃을 찾아 강가에 왔더니
無邊光景一時新(무변광경일시신) 사방천지 풍광이 일시에 변해 버렸다네
等閑識得東風面(등한식득동풍면) 무심코 지내다가 봄바람이 얼굴에 닿고서야 알았네
萬紫千紅總是春(만자천홍총시춘) 온갖 꽃이 만발하니 필경 봄이라는 것을.
시인은 겨울의 끝자락을 세월의 추이에 대한 큰 느낌 없이 무덤덤하게 날을 보내고 있었을 터이다. 이러한 시인의 무덤덤함을 일깨운 것은 모처럼 화창해진 날씨였다. 이런 날이면 꽃이 피었을 법도 하다고 느낀 시인은 꽃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수(泗水)라는 강으로 발걸음을 옮기었다.
강가에 이른 시인은 눈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풍광이 한꺼번에 바뀐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계절에 대한 무덤덤함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순간, 시인의 느낌은 확연히 돌아왔다.
완연한 봄바람이었던 것이다. 그제서야 시인의 눈에 꽃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 번 눈에 들어오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형형색색의 꽃들이 그 자태를 뽐내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이쯤 되자 시인은 봄이 왔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계절의 변화는 워낙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라서 일상의 시간에서 잘 감지되지 않는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진행되는 것이니만큼, 무덤덤한 세월을 한참 보내고 나서 문득 보면 계절이 바뀐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
주변 풍광이 바뀌는 것은 물론이고 꽃이며 풀이며 이파리들이 색과 모습을 바꾸어 나타나 있다. 이때 사람들은 좋든 싫든 세월이 흐르고 있음을 실감하게 마련이다.
/서원대학교 중국어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