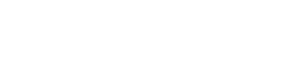그동안 `4년 동안 못한 건 8년, 12년이 돼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의원이든 단체장이든 제발 4년만 하라고, 4년도 길다'라고 주장해 왔다. 만약 4년 단임을 약속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두 손 들고 지지하겠지만, 사실 이건 답답해서 한 소리였다.
법이 한계로 정한 삼선을 굳이 채우려는 단체장의 욕심이 노회한 전직 고위 관료가 품은 `정년 연장의 꿈'으로만 보였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도 삼선쯤 되면 `더 큰 정치인으로 키워달라고, 그러면 5선, 6선이 되어 국회의장이 되겠다'라며 큰소리를 치는 게 꼴도 보기 싫었던 까닭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그동안 스스로 물러날 때를 아는 정치인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
사실 의회에는 다선도 필요하다. 경험이 있고, 동료 의원과 신뢰 관계를 잘 쌓은 사람이 의장단도 되고 상임위원장도 맡아서 갈등은 조정하고 이견은 조율해서 더 나은 대안을 만드는 일이 좋은 정치다.
그런데 대한민국 광역의회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읍·면장까지 선거로 뽑던 풀뿌리 지역자치는 5·16 군사쿠데타로 일거에 무너졌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1991년 지방의회선거가 부활했고, 1995년 시장·군수, 도지사도 선거로 뽑게 됐다. 단체장의 첫 임기는 3년이었다. 1998년부터 모든 지방 선출직을 동시에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전환하기 위해서였다.
한꺼번에 뽑으니 선거에 관한 관심도 높아질 테고, 여러 번 할 일을 몰아서 하니 유권자도 편하고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다는 심산이었으리라. 무엇보다 비용 절감 측면에서 동시선거의 효과는 탁월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30년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해보니 광역자치단체의 권력이 교체되면 의회 권력도 송두리째 바뀌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단체장과 의원 선거를 동시에 하고, 광역의회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까닭이다. 이러다 보니 늘 여대야소여서 의회의 고유 권한 집행부 감시 기능은 기대할 수 없다.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의회를 장악하는 여당은 초선 일색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 다선이 나오는 일도 쉽지 않다. 충북도의회를 예로 들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청주시의회의 경우 김병국 전반기 의장이 6선인데 반해, 충북도의회 황영호 전반기 의장은 초선이었다. 의장이 초선이다 보니 부의장도 초선, 상임위원장도 초선 세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시종 전 지사의 삼선 임기와 함께한 지난 11대 도의회는 전체 32석 중 28석이 민주당,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은 단 4석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김영환 지사로 권력이 넘어온 이번 12대 도의회는 총 35석 중 국민의힘이 28석을 휩쓸었다가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당선되면서 27대 8로 조정됐다.
결국 국민의힘에는 재선 이상이 6명인데, 그중 오영탁 의원만 지역구 재선이고, 이옥규 의원은 비례 후 재선, 김국기 의원은 보궐 뒤 재선, 이양섭, 임병운 의원은 11대에 낙선하고 재기에 성공한 이른바 `징검다리 재선'이다.
전반기 의장이 초선인 황영호 의원에게 넘어가고, 이번에 징검다리 재선 2인이 절치부심하며 “후반기에는 재선 의장”을 외치는 이유다.
그런데 한 사람은 2년 전 동료 의원에 대한 성희롱 시비가 불거지고, 다른 한 사람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비용 절감과 편의를 위해 동시에 치르는 지방선거지만 진짜 손해 보지 않으려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동시선거로 실시해야 한다.
아니면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바람을 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야 집행부 견제라는 고유 기능을 회복하고, 고를 수 있을 만큼의 의장 후보도 나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