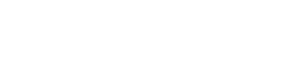어느 날 어디선가 본 듯한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걸음을 간신히 옮기고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막손 할멈이었다.
수철은 할멈의 변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를 안 지 아마 몇 해 쯤 됐는지 확실히 생각나지는 않지만 언제가 마당 수돗가에서 딸그락거리며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못보던 할멈이었다. 수철은 할멈에게 지금 거기서 무얼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할멈은 식당 그릇을 닦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수철은 할멈에게 그만두고 돌아가시라고 했다.
할멈은 그 말을 못 들은 척 그릇 닦는데만 열중이었다.
수철의 목소리가 당장 그만 두라는 큰 소리로 커져만 가고 그만 두지 못하는 할멈의 목소리도 그에 대항하느라 커져만 갔다. 할멈의 목소리가 커져만 가는데는 할멈의 수고비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당에서 시끌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식당주인이 나타났다.
수철은 대뜸 식당 주인에게 약속이 다르지 않느냐고 추궁하자 식당주인은 지금 그릇 닦는 일을 중단하게 된다면 할멈의 수고비를 수철이가 물어내라는 것이었다.
그 소리에 수철은 멈칫하였다. 식당주인의 협박이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소리에 화가 불끈 더 솟았지만 수고비라는 말에 우선 막손할멈에 대한 세상의 눈치였다.
수철은 못이기는 척 한 발 물러섰다. 어찌보면 물러서기를 잘 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알고 보니 골목길 끄트머리 대추나무집에 사는 한 동네 이웃할멈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막손할멈, 가시손 할멈이라고 부르던지 대추나무집 할멈이라고 불렀다.
그녀를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궂은 잡일에 거친 그녀의 손은 마구 쓰다 보니 가시가 돋은 것처럼 껄끄럽기 이를 때 없어 보여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인 것 같았다.
며칠 후 그녀를 다시 보았을 때 수철은 그녀에게 다가가 공손히 인사를 하며 한 동네 이웃인 줄 몰랐다고 사과를 하였다.
그녀는 웃으며 흔쾌히 받아 주었다. 인사를 하는 도중에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수철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말로만 듣던 가시손이었다.
손이 갈라지고 손 마디마디가 부은 것처럼 굵어져 있었으며 손톱은 다 닳아 있었고 살갗은 가시들이 불쑥불쑥 돋아나 뒤덮고 있었다.
무엇보다 식당주인과 수철의 관계로 인해 아무 상관도 없는 그녀에게 상처로 돌아갔다면 허드렛일로 생계를 이어가는 그녀로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었다.
다행히 모든 일이 큰 잡음과 무리 없이 지나갔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도 어쩌다 길에서 그녀를 종종 보았다. 비록 힘겨워 보였지만 비교적 건강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녀를 한 동안 보지 못했다. 보이지 않으면 기억도 멀어져 갔다.
그렇게 잊은채 몇 해를 지난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는 그녀를 보았다. 그 동안 못 본 사이에 그녀는 무척 수척하고 늙어 있었다.
더구나 지팡이에 의지해 꼬부랑 굽은 허리를 끌며 야윈 얼굴로 걸어가는 모습은 지팡이 없이는 한 발자욱도 걷지 못한다는 의미였다.
바라봄에 저 늙음이 몇 년 보지 못한 이유에서 온 것 같지 않았다. 수십 년을 품을 팔며 막손으로 가시손으로 얻은 대가가 치열한 생존의 고난과 늙음인 것 같았다.
그녀에게 떨어지지 않는 눈길에서 늙음 저편으로 또 하나의 이웃이 걸어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