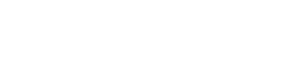삶의 경계에서 나를 찾아다녔다. 나를 찾기 위한 연출이 필요했다. 소품이 필요했고, 언어도 필요했다.
이미 포장하며 살아온 나를 헤집는 일은 쉽지 않았다. 사는 일이란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깊은 고민 끝에 새로운 설렘이 생겼다. 그래서 답답한 목마름을 외치고 싶었다.
본질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오뉴월에 하얗게 내리는 우박 앞에 속절없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거진 초록 위에 햇살이 뿌옇게 내렸다. 사람과 사람이 생각을 통해 사이가 깊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도 마찬가지겠다.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것에 나는 어쩔 수 없다.
인간이 시간과 만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어쩔 수 없나보다.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세상의 부조리 탓을 하며 너무나 아까운 시간을 낭비했다.
이제 어쩔 수 없는 것과 살아가는 시간 안에서 끝내야만 끝이 되는 것들에 대해 더 이상 징징대지 않기로 하자. 아프다고 말하지 말고, 소리내어 울지 않고, 기웃거리지 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자. 어쩔 수 없는 것에는 즐거운 일로 즐겁게 놀아보자.
이럴 때는 눈물이 난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는 눈물이 있었다. 결국 눈물은 삶의 필연적 연관이 있다. 눈물에는 꿈과 미래가 있고,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온 힘을 다해 길을 걸었고 영성을 바쳤다. 나뿐 아니라 세상 사는 모든 이 그랬을 것이다.
해방
푸른 별과 지구를 닮은 달을
누워서 가까이했다.
꿈속에서 마저 달아나지 못한 채
결국 삶의 판때기를 버렸다.
별도 달도 모두 누웠다.
자유는 더욱 과감해졌다.
아스팔트가 눕는다
빈 병이 누웠다.
살을 내주고 뼈를 지킨다.
새의 잠은 소행성으로 떠나는
마지막 열차를 탔다.
팔이 빠지도록 힘껏 하늘 향해 돌을 던진다.
시 「해방 」 전문
눈물로도 어쩔 수 없었나 보다. 심장으로부터 솟는 눈물로 세상 끝을 그리워하며 헤매는 가 보다. 내가 생각하는 삶에 의미는 다른 세상에서 찾아야 하나보다. 이쯤 되면 몸과 마음이 잘 있는지, 당신에 물어보고 나에게 물어본다.
늦었지만 몸과 마음의 변화를 살핀다. 사랑하는 일은 살아있다는 것,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자. 외로움과 두려움에서 오는 통증을 즐기자. 죽어야만 끝나는 게 아니다. 의식이 있거나 없거나, 어떤 형태로는 삶의 의미를 되새기자. 때가 되면 지구별 밖에서 “엄마 내가 왔어.” 하며 소리 질러 보자.
모든 것이 끝에 왔다고 생각할 때쯤, 세상 참 우연이 많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우연이 미련을 낳았다. 자크 데리다는 자기 죽음 앞에서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향해 미소 지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를 향해 미소를 지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고 보면 죽음 앞에서도 눈물 대신 웃어야 하나보다. 그러니까 어찌해도 안 된다는 것을 향해 껄껄껄! 웃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