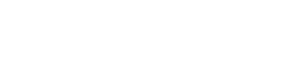숨바꼭질하며 뛰어놀던 우리들의 그 집,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해 질 녘 풍경이다.
굴뚝에선 모락모락 저녁연기 피어오르고, 주위가 어둑어둑 땅거미 내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뛰어노는 아이를 불러들이는, 온 동네가 다 들릴 것 같은 우리 엄마 목소리.
“경석아~~ 남희야~~~~ 밥 먹어라!”
잊지 말고 올해는 부추 좀 심어야겠다. 옆집 영남이네 부추가 튼실하던데 내친김에 얼른 다녀와야겠다.
여고 동창생인 상희와 소심했던 어린 시절을 성토하듯 이야기하며 무척 웃었다. 그토록 소심했던 촌닭들이 험난한 세상에 뒤지지 않고 무탈하게 잘 살아왔음이 서로 기특하다며 꺽꺽대며 웃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채 농장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강의까지 할 수 있도록 성격이 바뀐 나는, 스스로 생각해봐도 정말 대견하다. 그랬다. 무척 소심했다. 물론 지금도 그 기질이 내 안 깊숙한 곳에 남아 있어 가끔씩 쭈뼛거릴 때가 있긴 하지만 그 시절 비하면 많이 변했다.
오목한 동네, 마을 안에서만 놀던 내가 국민학교 입학하여 가장 싫었던 것이 있었으니 그건 다름 아닌 출석 체크였다. 아침마다 등교하면 선생님은 빠짐없이 한 명 한 명 호명을 하였고 아이들은 제 이름이 불리면 기다렸다는 듯이 빠르고 정확하게 “네!”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는 어떠했던가? 네. 그 한마디가 어려워 개미 소리만큼 입안에서 우물거렸으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당당하고 씩씩하게 `네.'는 커녕, `예에~'도 아닌, 강원도 특유의 사투리 어조로 “야아~~”라고 느릿하게 대답했다.
그나마 학교에서는 교실도 선생님도 친구들도 모든 것이 낯설어 그렇다 치자. 매일 매일 소꿉놀이하며 뛰어다니고 보고 또 봐서 익숙한 이웃집까지 심부름도 나는 죽기보다 싫었다.
집안에 좋은 일이 있거나, 가족 구성원의 생일처럼 특별한 날이면 엄마는 항상 떡을 했다. 봄철엔 쑥떡이었고, 여름 단오 무렵엔 뒷산에서 뜯어온 수리취떡으로, 추수가 한창인 가을엔 절편이나 송편이었고,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겨울밤엔 울타리콩과 대추를 듬뿍 넣은 시루떡이었다. 떡은 항상 저녁이 지나 밤이 다 되어서야 완성되곤 했는데, 엄마는 국수 대접 한가득 떡을 담아 호박잎을 뚝 따서 덮은 후 내 손에 들려주시며, 넘어지지 않게 찬찬히 잘 다녀오라 일러주신다. 앞집, 옆집은 물론 꽤 거리가 있는 산 아래 목장과 심지어 개울 건너 경미네랑 윤숙이네까지 다녀와야만 했다. 동생들은 어려서 밤길에 내보낼 수 없었고 떡 돌릴 대상은 항상 나였다. 가로등 하나 없던 시절인데다, 각종 귀신이 난무하던 때라, 어린 여자 아이가 어둠 속을 뚫고 걷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게 어둠이나 귀신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으니 목적지에 도착하여 주인을 불러내는 일이었다.
조심조심 걸어가며 중얼중얼 되뇐다. “계세요?” “계세요?” 그 세 글자가 어찌나 어려웠는지 가면서 내내 연습을 한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입이 떨어지질 않는다. `계세요?' 그 세 글자는 내 입 밖을 나가지 못했고, 결국 집주인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문밖에 가만히 서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그나마 개를 키우는 집은 괜찮았다. 울타리 근처 도착하기도 전에 곧바로 개가 짖고 주인이 나오니까.
많이 변했다. 이제는 옆집에 가서, “계십니까?”는 물론, 넉살 좋게 올해는 부추 좀 심고 싶으니 날 풀리면 몇 뿌리 좀 캐어 달라 말하고 있으니….
어느새 나도 동네가 다 들릴 듯한 목소리로 당당하게 아이들을 불러들이던, 그 엄마가 되었나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