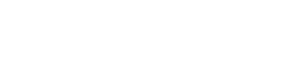요즘 개와 고양이 등 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해 `반려동물'이라는 호칭이 생겨날 정도다. 인간에 의해 가축화된 후 인류 역사에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물이 소다. 노동력을 활용할 뿐 아니라 부산물인 우유, 비료이자 땔감인 쇠똥까지 얻어낼 수 있는 요긴한 동물이 바로 소인 것이다. 근대 이전까지 소는 지역 공동체의 공동 재산으로 농사를 짓는 데 필수이자 가장 값비싼 재산이었기에 잡아먹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가축 중 유일하게 이름을 불러주는 동물이 소다.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청동기 시대 이전부터 키우기 시작했는데 고조선의 유적지에서 다량의 소, 말, 돼지, 닭 등의 뼈가 출토되고 있어 소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여의 사출도 중 하나인 `우가'의 뜻에서도 소와 관련된 점을 알 수 있다. 기록상 신라 지증왕 때 소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 우경법을 국가 차원에서 장려했다. 조선시대 평민들은 말 대신 소를 타고 다니기도 했다. 맹사성처럼 선비들도 소를 자주 타고 다녔다. 이처럼 이동수단이면서 농사에 요긴하며 심지어 양질의 고기가 되어주는 소의 가치는 산업화 전까지는 그 가치가 아주 컸으며 아직도 시골에서는 소가 큰 재산으로 인식된다.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동북쪽 골짜기엔 무암사가 있다. 무림사와 무암사는 몇 가지 비슷한 창사설화가 있다. 통일신라 때 큰 스님 의상대사가 무림사를 세우려고 금성면 성내리 산골짜기에 왔다. 의상대사는 아름드리나무를 잘라 다듬어 목재를 만들어 힘겹게 나르고 있었다. 그나마 목재를 나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람의 힘이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의상대사가 힘겨운 일을 하며 땀을 흘리고 있을 때 어디선가 소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목재를 운반해 주는 것이었다. 무림사는 뜻밖에도 소가 힘든 일을 거들어 주는 바람에 손쉽게 세워졌다. 의상대사는 소를 보내 주신 것은 부처님의 공덕이라고 생각했다. 대사는 이 소를 극진히 위해 주었다. 그러나 얼마 뒤에 소는 죽고 말았다. 의상대사는 죽은 소를 화장했다. 그랬더니 죽은 소의 뼈에서 여러 개의 사리가 나왔다. 소의 불심에 감동한 대사는 사리탑을 세우고 그 속에 소의 사리를 넣어 소의 덕을 기렸다. 이런 까닭으로 사람들은 무림사를 우암사(牛岩寺)라고 부르기도 했다.
다시 오랜 세월이 흘렀다. 어느 해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이 바람에 무림사 뒷산이 산사태로 무너져 내리면서 무림사도 무너지고 말았다. 이 자리에는 새로 절이 세워졌다. 새로 지은 절의 맞은편 산에는 두 개의 바위가 있다. 그런데 날씨가 맑을 때면 두 개의 바위가 희미하게 보이지만 안개가 짙게 끼는 날이면 두 개의 바위가 겹쳐서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바위를 `안개 바위' 또는 `무암(霧岩)'이라 불렀으며 무림사 자리에 새로 지은 절의 이름을 무암사(霧岩寺)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이야기와는 약간 다른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 첫째로 무림사를 지어준 소가 죽었을 때 죽은 소를 건너편 골짜기에 매장했다는 것이고 이 골짜기 이름을 `소두부골'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둘째, 소가 재목을 운반해 준 것은 무림사 창건 때가 아니라 무암사 건립 때 일이라는 것이다. 셋째, 무암사 건너편 바위를 노문암(老文岩)이라 하고 맑은 날씨에는 산과 바위가 하나로 보여 뚜렷하지 않으나 안개가 끼면 바위가 뚜렷이 보이고 그 모양이 마치 늙은 스님이 팔짱을 끼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아무튼 무림사이건 무암사이건 이 이야기가 소와 관련된 이야기인 것을 보면 소를 위하는 우리 민족의 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