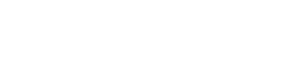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32.28%로 집계됐다.
사전투표는 10년 전인 2014년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했다. 이후 이번 선거를 포함해 모두 여덟 번의 전국 동시 선거가 있었다.
사전투표율의 경향을 보면 지방선거는 낮고 총선, 대선의 순으로 올라간다.
실제로 △2014년 5회 지방선거 11.5% △2016년 20대 총선 12.2%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26.1% △2018년 7회 지방선거 20.1%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 26.69%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36.93% △2022년 8대 지방선거 20.62%였다.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선거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사전투표율이 전반적으로 상승세인 것이 분명하다.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합쳐 투표일이 사흘로 늘어났으니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다고 높아지는 사전투표율만큼 최종투표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투표가 사흘에 걸쳐 골고루 분산되고 있을 뿐이다. 20대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19대 대선보다 10.83%p나 높았지만, 최종투표율은 77.1%로 77.2%였던 19대보다 낮았다. 사전투표율이 50%를 넘어서면 사전투표가 본투표가 되고 본투표를 `마감투표'나 `보완투표'로 이름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다.
재미있는 점은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한 거대 양당의 해석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을 향한 기세”로 평가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는 열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성향의 정당이, 낮으면 보수성향의 정당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통설이었다.
이는 `여농야도(與農野都)' 이론이 통하거나 20~30대가 진보적이던 시절에는 정설이었다.
농촌보다 도시의 투표율이 낮고, 노인 세대에 비해 투표소로 가는 청년들이 적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5·16 군사쿠데타 이후 노태우 정권까지 30여 년간 여농야도 현상이 뚜렷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지역 구도가 뒤섞여 예전 같지 않다.
20~30대의 진보성향도 1980년~1990년대 민주화운동 세대의 이야기다. 지금은 이들이 40~50대가 됐다. 현재의 20~30대는 선거마다 다른 표심을 드러낸다. 남녀의 표심이 갈릴 때도 있다.
상황이 이러니 단순히 투표율이 높고 낮음으로 유불리를 예측하는 건 쉽지 않다.
결국 여야 모두 “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장담하지만, 이 문장에는 `우리 편'이라는 주어가 생략돼있다. 단순한 허세가 아니다. 정치가 그만큼 철저하게 `팬덤(fandom)'으로 양분돼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미래를 향한 전망은 없다. 오직 우리 편의 결집과 상대에 대한 심판만 외치고 있을 뿐이다. 선거 막판이 되자 `정권 심판', `3년도 길다'는 야당의 주장에 여당이 `야당 심판'으로 맞서는 해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가 할 일은 많다. 낮은 출생률과 지역소멸을 출산장려와 인구 유입 정책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주거와 교육, 의료 등에서 이웃 시·군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청주시민이면서 동시에 보은군민도 될 수 있다면 어떨까? 문 닫은 학교를 기숙형으로 바꾸고 농촌 빈집을 공유 별장이나 주말농장으로 바꿀 수 있다면? 정치가 꿈꾸면 가능한 일이다. 이번 총선에선 글렀다. 다음엔 꼭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