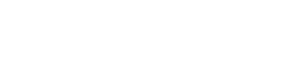“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단 한 번도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내보지 않고 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마주할 수 있나?”
클레어 키건, 《이처럼 사소한 것들》의 핵심 문단이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일상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며 주인공 빌 펄롱처럼 그 사소한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사는 선량한 국민이 더 많은 세상이다. 그러한 그들의 준법정신과 정도 지향으로 이 땅의 봄은 계속되는 것이다.
이따금 봄의 성격을 띤 큰 범죄들이 국가 권력과 결탁하여 은폐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썩은 조직 하나가 사회 전체를 부패시키기는 어렵다. 지금도 지구촌 어딘가에 작품 속 배경인 아일랜드 선한목자수녀회의 막달레나 세탁소 같은 부조리한 조직이 사랑과 구제라는 이름으로 횡행할지도 모른다.
타락한 여성을 수용한다는 명분으로 1996년까지 은폐되어 운영된 막달레나 세탁소는 성매매 여성, 혼외 임신 여성, 고아, 성학대 피해자, 정신이상자, 성적방종평판자, 외모가 수려하여 남자를 타락시킬 위험성이 있는 잠재적 가능자 등 여자와 어린 소녀들을 잡아다 감금하고 무임금 빨래 노동을 시킨 은폐된 감옥이다.
우리나라도 국가 정부와 연합한 혹은 등에 업은 조직이 더는 이 세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부름을 받은 정치인들은 국민의 깊은 뜻을 진심으로 살피고 사소한 것들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참 대리자가 되어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한시적인 겸손과 섬김이 아니라 국민들의 염원을 진심으로 살피는 정의로운 역할 말이다.
선출된 정치인들을 보면 그 나라 국민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한다. 투표를 안 한 적은 없지만 기쁜 마음으로 참여한 적은 없다. 국민을 대하는 그들의 웅변이 늘 상업적이고 한시적인 까닭이다. 정치 후보자가 우월해서 혹은 정의로워서 투표하고 선출하는 것은 아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 참여 거부에 대한 불이익 중 하나는 자신보다 하등한 존재에게 지배당하는 것을 피하는 데 있다고 했다. 그런 연장선으로 투표를 거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류의 정치인이 득세하는 세상이고 보니 불구경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승자박이다. 그리스의 견유학파 디오게네스처럼 권력과 욕망보다는 햇빛을 추구하며 나 홀로 빗장 건 외딴방의 삶이었으니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소한 것들에 목숨 걸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소한 것들마저 결박하여 불의를 자행하는 부패 조직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향동하지 않고 소리 내지 않은 삶,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치부하고 일반화시키며 불구경했던 일들, 거리로 나가 행동하지 않는 율법적인 기독교인의 삶 속에 나도 있다.
그래도 대부분의 국민은 《이처럼 사소한 것들》의 주인공 빌 펄롱처럼 자기 검열과 제 몸 잘 다스리며 공동체와 약속한 원칙대로 살 뿐 편법은 모른다. 옆문, 뒷문, 샛문, 곁눈 쓴 일 없이 각자의 수고와 노동으로 정문만을 지향하는 삶을 산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막달레나 세탁소 캄캄한 창고 안에 감금된 어린 소녀를 구해내는 일, 불의에 맞서 용기 내는 빌 펄롱 같은 선량한 국민들이 있기에 봄은 다시 온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이라도 불의에 맞서 용기 낼 그 겨울을 통찰하는 일, 그것이 이 땅의 봄을 만든 의로운 이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