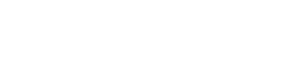설레발도 이런 설레발이 없을 듯하다. 지인의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창고를 정리하면서 카시트며 식탁 보조 의자, 어린이 자전거 등을 나눔 한다는 얘길 들었다. 듣자마자 나에게 달라고 했다. 임신 중인 작은딸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물론 복(腹)중에 있는 고래(태명)가 자전거를 타려면 적어도 사오 년은 기다려야 할 테지만, 머릿속에는 벌써 손주가 자전거 타고 달리는 풍경이 그려지는 것이다.
뉴스를 보다 보면 저출산 극복 정책에 관한 내용이 자주 들려온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의 출산율이 0.72%로 인구 감소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막내 낳을 때 셋째여서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기억이 있는 걸 보면 1997년까지만 해도 산아제한을 했던 것 같은데….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가 자녀 출산의 정석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으니까.
요즘 표어는 `아이가 희망이다'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토론회, 캠페인, 포스터들도 봇물 터지듯 넘쳐난다.
부모라는 무게감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출산 육아에 필요한 정보와 경제적인 지원도 다양하게 제공되고 임신부를 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확실히 달라진 것 같다. 핑크 배지(badge)를 훈장인 양 가방에 달고 다니는 딸아이를 보면 약간의 격세지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저출산 극복 가능성을 보는 듯해 기분 좋다. 입덧 순한 건 더 반갑고.
나는 첫 아이 임신하고서 심한 입덧에 시달렸다. 도통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물만 먹어도 토하고 끊임없이 헛구역질이 났다. 내 기억에 먹고 괜찮았던 건 남편이 목장에 왕진 갔다 올 때 따다 주던 시퍼런 자두뿐이었다. 체중은 점점 줄어서 처녀 시절 수많은 다이어트에도 달성할 수 없었던 최저점을 찍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연락도 없이 오셨다.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서. 여름방학을 이용해 교원대학교에서 교장 자격 연수를 받고 계실 때였다. 한 번에 오는 버스도 없어 몇 번 갈아타야 하는 길을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 하나 들고 물어물어 찾아오셨다. 그래놓고는 또 바로 들어가 봐야 한다며 땀 식힐 새도 없이 일어나셨다.
그렇게 꿈처럼 다녀가신 그땐 몰랐다. 고명딸이 입덧으로 아무것도 못 먹는다는 소식을 듣고, 반나절 짬이 생기자 아버지는 혹시 입맛에 맞을까 싶어 온갖 과일을 사 들고 오셨던 거다. 빠듯한 시간에 부랴부랴 오느라 점심도 못 드시고는 딸 힘들까 봐 겨우 냉수 한 사발 청해 시장기를 달래고 가셨다. 그래서 철들고부터 그날을 떠올리면 나는 늘 눈물바람이다. “엄마가 잘 먹어야지 아기도 건강한 거야. 허서방한테 먹고 싶은 거 사 달라고 해서 잘 먹어.” 당부하고 돌아서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최민자의 수필 <아이가 엄마를 낳는다>에 이런 말이 있다. `여자가 첫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두 사람이 동시에 태어난다는 뜻이다.' 출산은 `엄마'로 스스로를 낳는 것이기도 하다는 말이다. 또 나비가 배추벌레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듯 엄마가 된 여자는 딸이었던 여자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깊이 공감하며 읽었다.
할머니의 삶은 그럼 얼마나 다를까? 기대 반 우려 반, 동시에 태어날 `한 아이'와 `한 엄마'를 기다리며 나 역시 `한 할머니'로의 세 번째 탄생을 준비 중이다.
체감상 사오 년 세월은 그리 길지 않다. 설레발이 아니라 자전거를 밀어줄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