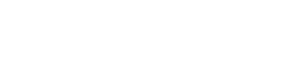21세기를 살아가는 삶의 양태로는 새벽 길을 걷는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일 것이다.
설사 걷는다 해도 그때 마주치는 풍광은 지금과 사뭇 다르다. 지금 같은 도회지의 삶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자연적 풍광이 새벽 특유의 느낌을 자아내게 하였을 것이다.
겨울만큼은 아니지만 부쩍 차가워진 가을 새벽에 길을 나선 사람이 있었으니, 조선(朝鮮)의 시인 박지원(朴趾源)이다. 그가 만난 새벽 풍광은 어떠했을까?
새벽길(曉行)
一鵲孤宿黍柄(일작고숙촉서병) 까치 한 마리 홀로 수숫대에 잠들어 있고
月明露白田水鳴(월명로백전수명) 달은 밝고 이슬은 희고 논에는 물이 울리네
樹下小屋圓如石(수하소옥원여석) 나무 아래 작은 집은 둥근 돌 같고
屋頭匏花明如星(옥두포화명여성) 지붕 위의 박꽃은 별처럼 환하네.
무슨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시인은 가을 이른 새벽에 길을 나섰다. 시인이 맨 처음 만난 풍광은 아주 보기 드문 것이었다.
추수가 끝난 깡마른 수수의 줄기 위에 앉아서 자고 있는 까치 한 마리가 그것이다.
아침 이른 시간에 마당 감나무에 앉아 우는 까치는 흔한 모습이지만, 그 몇 시간 전에 자던 모습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광경이다.
그런데 시인은 용케도 그 희귀한 장면을 접했다. 새벽 길을 나선 데에 대한 선물치고는 제법 후한 것이었다. 밝은 달과 흰 이슬은 가을 새벽의 흔한 풍광이지만, 논에서 물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니다.
시각적 감각과 청각적 감각의 조화를 이루어 내려는 시인의 의도가 보이는 장면이다.
계속해서 길을 걷던 시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번에는 큰 나무에 가려 보일락말락한 작은 집이었다. 시인의 눈에 나무 밑에 박혀 있는 돌처럼 보일 만큼 작아서 집 같지 않았지만 그것을 집이라고 확신하게 만든 것이 있었다. 지붕 위에 환하게 피어 있는 박꽃은 시인의 눈에는 하늘의 별 같아 보였다.
새벽에 자기 집 마당에 나서거나 동네 고샅을 돌아다니는 일은 예전에는 흔한 일이었지만 요즘은 좀처럼 없는 일이다. 그만큼 요즘 사람들은 새벽 풍광에 낯이 설 것이다.
낯선 장면을 찾아 먼 여행을 떠나는 만큼이나 차가운 가을 새벽에 동네 고샅 밖으로 나서 그 시간만이 줄 수 있는 풍광들을 접하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서원대 중국언어문화전공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