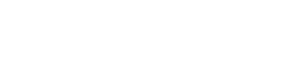어린 시절 자연은 나에게 소중한 놀이터이자,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숲 속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좋아했고, 그중에서도 특히 들꽃을 좋아했는데 그로 인해 혼이 난 기억도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 자란 곳은 강원도 평창의 골 깊은 마을로,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하늘만 빠끔히 보이는 곳입니다. 어른들이 밭일하러 나가면 또래 아이들과 함께 집 앞 개울가에서 동급살이로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현호색의 동그란 뿌리는 동급살이에서 감자가 되었고, 통조림 깡통에 물과 함께 넣은 다음 보글보글 삶았습니다. 연한 풀잎 따다가 나물 반찬도 야무지게 만들었고, 누르스름한 진흙 풀어서 된장국도 꽤 그럴듯하게 흉내 냈습니다.
그 마을 취학 전 아이들이 다 그랬겠지만, 워낙 시골인지라 마을 밖을 벗어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마을 언저리의 무덤가에서 뛰어놀긴 했지만, 대부분은 집 앞 개울가에서 동급살이로 해가 저물곤 했습니다.
그렇게 마을 안에서만 놀던 꼬마둥이가 국민학교 입학 후 3km 정도의 거리를 걸어 마을 밖, 학교까지 가는 길은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고, 세상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른 혼자 걸어가면 꼭 맞을 넓이의 오솔길, 꼬불꼬불 산길을 걷고 걸어, 다랑논도 지나고 산 중턱 고갯마루 하나를 완전히 넘고 나면 읍내 학교였습니다.

그 무렵 봄이 다 지나고 여름이 막 시작될 5월쯤이었는데, 늘 다니던 산길 가에 전날까지도 없던 연미색 꽃잎이 아주 넓적하니, 커다랗게 피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꽃은 성인이 된 후에서야 이름을 알게 되었는데 `큰꽃으아리' 즉, 클레마티스의 야생 우리꽃 입니다.
“어? 저기도 있네?”꽃을 쫓아가 본 사람은 알겠지만 빨려들 듯 정신없이 산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 그 꼬마둥이 역시 모든 걸 잊은 채, 커다란 꽃에 이끌려 산속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헤매고 나서야 학교 가는 길이란 걸 깨달았지만,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고 교실에 도착했을 땐 반나절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담임 선생님께 무섭도록 혼이 났답니다. 어찌나 두들겨 맞았는지…. 사실,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일인데, 그 시절 선생님들은 조그만 잘못도 그냥 넘어가는 일 없이 반드시 매를 들었던 일이 다반사였으니 그렇게 별스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숲 속이 좋고, 하늘이 좋고, 어려서부터 들꽃을 좋아해 그렇게 정신없이 빠져들었는데 나이 오십이 넘도록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 도심을 떠나 귀농을 결심했고, 고향을 닮은 미동산 자락, 미원리를 선택했습니다. 1,000여평 농장 부지의 한쪽에, 3연동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커피나무와 민트, 레몬나무를 키우며, 그 옆엔 자그마한 커피집도 열었습니다. 본업은 농부, 부업은 바리스타! 호미질하랴, 커피 만들랴 이리저리 몸은 무척 바쁘지만, 흙 냄새 맡을 수 있고, 사계절이 변화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 매일 매일 좋은 날 보내고 있습니다.
산에서 물가에서 농장에서, 식물을 바라보는 시간만큼 가슴 설레는 일은 더 없습니다. 앞으로 이 연재를 통하여 틈틈이 농부의 하루와 함께 풀꽃이야기, 시골 살이, 청마담의 소소한 일상 전해 드리겠습니다.
*필진:엄남희 농업회사법인(주) 두봉 대표, 뜨렌비팜 대표, 농부 뜨렌비 한방꽃차교육원장, 카페 뜨렌비 대표, 숲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