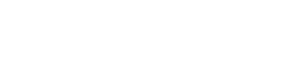`김영자'라는 자신을 감춘 채, 한때 위안부였던 `가네코 에이코'라는 이름으로만 기억되다가 목숨까지 끊으려고 했던 거짓말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일이 있습니다.
무슨 큰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홀로 감당하며 숨어 살다가, 위증과 왜곡으로 얼룩진 역사에 분노해 살아 있는 증인으로 떳떳하게 나서서 이를 고발하는 자리에 서게 된 영자의 이야기였지요.
그동안 영자가 해온 거짓말이 너무도 하얗고 슬퍼서 멀쩡한 하늘이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만 않은 게 아닐까 싶더군요.
“정이월 다 가고 삼월이라네/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면은/이 땅에도 또다시 봄이 온다네/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하얗고 슬픈 거짓말을 하며 살아온 영자가 부른 아리랑을 생생하게 들었던 그날이었습니다.
영자가 부른 아리랑을 듣다가, 벽이 보였습니다.
너와 나를 가로막은 담장의 높이를 가늠할 수 없어서 기다림에 지친 학처럼 길게 목을 빼들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두께가 어마어마해서 아무리 살가웠던 인연들도 두 동강 내버리고, 온 힘을 다해 두드려도 꿈쩍 않는 벽이었습니다.
영자가 부른 아리랑은 시간이 쌓일수록 힘에 부치기만 하는 오해와 편견의 벽 때문에 우는 노래였습니다.
영자가 부른 아리랑을 듣다가, 세숫대야가 보였습니다.
내 죄는 없고 나는 모른다고 말하던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씻던 세숫대야가 아니었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라는 윤동주의 시 `자화상'에 나오는 밉다가 가여워지고, 밉다가 그리워지는 한 사람이 아무리 몸을 씻어도 눈물만 흘리게 되는 세숫대야였습니다.
영자가 부른 아리랑은 단장(斷腸)의 세숫대야 때문에 우는 노래였습니다.
영자가 부른 아리랑을 듣다가, 옷고름이 보였습니다.
억지로 끊어지고만 옷고름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풀어헤친 적 없던 옷고름이 잔인했던 제국주의 칼날에 베였던 상처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어서 가슴 깊숙이 품고만 있었던 아픔이었습니다.
영자가 부른 아리랑은 옷고름 때문에 우는 노래였습니다.
(지난 10일에 청주시립무용단이 삼일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올해를 맞아 제40회 정기공연으로 무대에 올렸던 “영자가(歌)...하얀 거짓말”을 보고 쓴 리뷰입니다. “하얀 눈물의 꽃이 필 때까지 잃어버렸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세월과 아픔을 기억하고, 두드려 말하겠다”는 청주시립무용단의 뜻이 오롯하게 무대로 옮겨졌습니다. 그날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인 김진미는 “영자 할머니가 느꼈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가슴 먹먹함, 말로도 더 채울 수 없는 슬픈 노래를 가슴 떨림의 호흡과 춤으로 채워 보자”는 사명감을 절절히 표현했고, 관객은 진한 감동에 빠져 더할 수 없이 뭉클했습니다.)
/에세이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