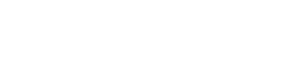인간은 다른 어떤 생명체보다도 무기력한 상태로 태어난다. 걷지도 못하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털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태어난다. 인간은 취약한 상태로 태어나는 만큼 부모(타자) 의존도가 심하다. 곧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홀로 서지 못한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독립적 존재가 아니고 타자 의존적인 존재이다.
나이가 들어 자아가 형성이 될 때에도 타자와의 어울림을 염두에 두고 스스로를 만들어간다. 속으로는 미워 죽겠어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말하고 행동한다. 죽을 만큼 좋아하지만 표현을 하지 않고 죽이고 싶어도 절대로 내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세상 사람과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사람(자아)이 된다.
타자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아의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윤리 의식이 체화되어야 비로소 건전한 시민이 되고 사회적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와 타자(自-他)의 조화로운 관계가 사회적 삶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이게 우리네 일상이다.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어울려 살다가 가는 게지 또 뭐가 있겠는가.
그 이상은 없을까?
인생의 일상성을 흔들어 놓는 질문을 던져보자. 성공한 사회인이 내 삶의 목표일 수 있을까? 다른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나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되는 게 아닐까? 타자와의 관계에 치중하다가 보면 나는 상사의 마음에 드는 인간, 연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인간, 부모에게 효도하는 인간, 자식을 사랑하는 인간 등이 망라된 종합선물세트 형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닐까?
내 안에는 타자와의 관계 가운데서 평온함을 느끼는 면만 있을까? 그렇지 않다. 탐나는 물건이 있으면 불법적으로라도 취하고 싶고, 매력적인 이성을 보면 흑심을 품기도 하고, 원수 같은 인간을 죽이고 싶어 하기도 한다. 온갖 들끓는 마음을 마음 안에 간직한 채로 우리는 평온한 얼굴로 다른 사람과 마주한다. 그래서 지킬박사와 하이드 씨가 등장한다. 모범적인 직장인이나 학자, 법조인, 의료인이 집에서 폭군으로 변하는 경우도 생긴다.
상대가 보는 나는 사실 내가 아니다. 상대는 타자와 접하면서 습관화된 표정을 짓고 있는 나를 볼 뿐이다. 나는 가면 속에 숨어 있다. 가면을 집어던지면? 사회적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 `나는 당신과 자고 싶어',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같이 살기 어렵다. 그래서 가면을 집어던지기 어렵다. 가면을 벗어 던지지 못한다고 해서 내 안에 들끓는 마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들끓는 마음을 감추고 평온을 가장한 채로 사는 삶은 솔직한 삶이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시선이 안으로 향할 때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 흉하고 부끄러워서 소스라치게 놀란다고 말한다. 어렵고 힘들지만 내 안의 들끓는 상태를 인정하고 그걸 직시해서 뚫고 나가야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온다. 내 안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태, 스스로 인정하기 부끄러운 마음을 마주하지 않으면 그걸 퇴치할 수 없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다른 사람이 대신 풀어줄 수 없다. 나의 들끓는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내 안의 들끓는 마음을 부인하거나 피하면 나도 내 문제를 풀 수 없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걸 피한다면 그 문제는 풀리지 않은 채로 숨어 있게 된다.
타자에게 맞춰진 자아는 내 안의 폭풍우를 직시하지 않는다. 곧 자신의 문제를 풀 기회를 놓치게 된다. 자신의 난폭하고 추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자신의 문제를 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사회적 자아를 벗어던지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고 씨름하려면 스스로에게 솔직해야 하고 그래야 자신의 실존적 문제를 만날 수 있다. 인격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나 같은 사람은 특히 자신에게 솔직해야 한다.
/충북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