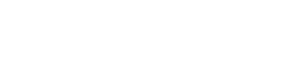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비로소 집에 돌아와 박노해 시집 `노동의 새벽'을 읽는다.
이 시각, 오래된 시를 꺼내 읽는 것은 문자에 대한 갈증 때문만은 아니다.
밤을 꼬박 새우며 `대기업의 맛'을 위한 식재료와 씨름한 탓에 온몸의 근육이 떨리는 `새벽의 몸'에 대한 서러운 위안이라 하겠다.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거운 소주를 붓는다/ 아/ 이러다간 오래 못가지/ 이러다간 끝내 못가지/ (중략) 탈출할 수만 있다면/ 진이 빠져, 허깨비 같은/ 스물아홉의 내 운명을 날아 빠질 수만 있다면/ 아 그러나/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죽음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 이 질긴 목숨을,/ 가난의 멍에를,/ 이 운명을 어쩔 수 없지(하략) <박노해. 노동의 새벽>'
깨우침을 주는 오래된 것들은 대체로 고전(Classic)이 된다. 그 빛바랜 것들은 때로는 가야할 길을, 또 어떤 때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드러나게 하는 죽비가 되는데, 사는 동안 우리가 경각하지 못할 뿐이다.
시집이 처음 출간된 해는 20세기 때인 1984년, 벌써 39년 전이다. 그동안 책꽂이에 정갈하게 꽂혀, 몇 번 꺼내보지 않았던 시집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 누렇게 빛이 바래 있으니, 사람 손을 타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바스라질 것 같이 위태롭다. 예순이 훌쩍 넘도록 살아오는 동안 나에게 `노동'은 무엇이었던가.
아주 어린 시절 집안일을 돕기 위해 힘을 썼던 일을 제외하면 `몸'을 사용했던 기억은 별로 없다.
`육체'와 `정신'으로 `노동'의 본질을 구분할 때, 나는 주로 `정신노동'의 범주에서 여태 먹고 살아왔다.
그러나 버티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육체노동'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살아남는 일이 박노해의 핏빛 절규처럼 `전쟁 같은' 사투임을 온몸으로 깨닫고 있다.
어느새 밥상을 장악한 `대기업의 맛'은 하루 스물네 시간을 멈추지 않는 3교대 `노동'으로 이루어진다. 육중한 무게의 식물은 물론 인간이 섭취하는 동물의 사체를 산더미처럼 먹을 수 있게 처리하는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중년 이상의 여성들이다. 그리고 치열한 청년들과 나처럼 절박하게 늙은 남자들도 간혹 섞여 있다.
신분 또한 제각각이어서, 대기업 정직원, 대기업 계약직, 대기업 아르바이트, 하청업체 정직원, 하청업체 계약직, 하청업체 알바생 등 대충 따져도 6단계의 보이지 않는 계급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새벽에, 한낮에, 한밤중에 출근해서 다시 한밤중에, 한낮에, 새벽에 퇴근하는 이들은 먹고사는 일에 용감하지만, 자랑스럽지 못하다.
겉모습은 관광버스인 출근차량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흘러갔다 흘러들어오는 행렬은 풍요로운 풍경이 아니라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가 짓누르는 전쟁터의 보급로와 다를 바 없다.
빡빡하게 돌아가는 8시간의 노동을 마친 육체는 서럽게 떨린다. 익숙하지 않은 근육을 마구 사용해야하는 `몸의 노동'은 가난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비굴하지 않다.
지친 몸이 절대 이기지 못하는 퇴근길 관광버스 안의 쪽잠이 얼마나 달큰한 지, 기계처럼 돌아가는 작업에서 쳐지지 않았다는 안도감조차 행복으로 느끼게 되는 카타르시스가 `몸의 노동'에는 있다.
헌법에 `노동'이 없고, 학교에서도 `노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노동'의 피·땀·눈물 대신 영혼마저 팔아먹는 `영끌'을 현혹하고 조장하는 나라의 위태로움이 아찔하다.
`노동의 새벽'을 서러워하던 박노해 시인의 절규가 39년이 지나도록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지금은 오히려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는 `몸의 노동'을 안도해야 하는 시대.
`(전략) 아 우리도 하늘이 되고 싶다/ 짓누르는 먹구름 하늘이 아닌/ 서로를 받쳐 주는/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푸른 하늘이 되는/ 그런 세상이고 싶다.<박노해 <하늘>'
충혈된 눈, 근육이 떨리는 노동의 새벽, 그 지친 몸에 열리는 하늘은 한꺼번에 붉지 않고, 순식간에 푸르지 않으니 `노동'의 존엄한 가치를 믿으며 잘 버텨야 한다는 최면으로 깊은 낮잠의 수렁에 빠져 아직도 침몰하는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