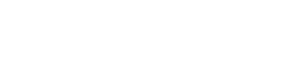대한민국의 합계출생률 0.72명이니 이대로 가다가는 소멸하는 시·군이 적잖을 거라는 경고가 연일 매스컴을 탄다. 종국에는 대한민국이 사라진단다.
통계와 추이를 보면 맞는 얘기처럼 들린다. 하지만 통계가 착시와 겁박으로 국민을 통제하는 데 악용된 사례는 부지기수다. 두려움에 떠는 상대는 조종하기 쉽다.
소멸을 저지하기 위해서 출생을 장려해야 하고, 시장·군수는 시혜인 양 장려금을 뿌린다.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선 공장이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소멸 대응 기금'은 산을 깎고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쏟아붓는다. 이게 소멸을 늦추거나 막자는 것인지, 마지막 순간까지 자본과 개발잔치를 벌이자는 것인지 헷갈린다.
우리나라(남한)는 인구가 적은 나라인가? 5150만 명으로 세계 30위 안에 든다.
인구밀도는 세계 25위 수준인데, 마카오, 모나코,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외에 이름이 생소한 도시국가들을 앞세웠을 뿐 우리보다 면적도 크고 인구밀도도 높은 나라는 방글라데시 하나뿐이다.
지금의 40~50대는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거나 `둘도 많다'라는 구호 속에서 산아제한을 뚫고 세상의 빛을 본 존재들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인구는 절대 적지 않다. 지금도 많다.
문제는 역(逆)삼각형 형태의 연령대 비율과 과도한 수도권 집중이다. 평균수명은 늘어나는데, 현재의 출생률이 세계 최저 수준이니 부양받는 인구와 부양할 인구의 비례에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결혼을 서두르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사실 이 문제는 인구의 도시집중, 특히 수도권 과밀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문제와 해법은 뒤엉켜 있어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헷갈리는 상황이고, 정부와 정치인, 지역 정부는 갈수록 즉자적 대응에만 몰두하고 있다.
인구소멸 위기 군(郡)에서 출생장려금으로 출생을 유도한다고 한들 아이들이 자라면서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즈음이면 어떻게든 도시로 나간다. 공무원들의 주소만 옮겨서 통계상 인구를 늘리려는 눈속임도 흔한 일이다.
하지만 어떤 수를 써도 대도시만 인구가 느는 건 일반적인 현상이다. 충북만 하더라도 도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청주가 인근 시·군의 인구를 더 빨아들이려 한다.
외려 인구를 나누어 줌으로써 주변 시·군과 함께 주거와 취업, 창업, 교육, 의료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는 없는 걸까?
사실 시·군은 이런저런 이유로 얼마든지 소멸할 수 있다.
충북만 보더라도 1995년 중원군, 제원군이 각각 충주시와 제천시로 통합되면서 사라졌다.
2014년에는 청원군이 청주시에 통합됐다. 1990년을 전후해 경기도의 일부 시·군만 빼고는 전국에서 시·군이 통합하면서 여러 시·군이 소멸했다.
오래전 얘기를 할 것도 없다. 2024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여당 대표가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서울 인근에 있는 여러 시·군들이 너도나도 `소멸하고 싶어서' 술렁거렸다. 이런 소멸은 대환영이고, 다른 소멸은 안 된다는 기준이라도 있나?
사실 정치권은 옥상옥(屋上屋)인 광역자치단체를 없애고 행정을 단순화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구상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일이다. 광역시·도의 소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일반론이다.
인구가 9000명에 불과한 울릉군도 지방선거로 군수와 도의원 한 명, 군의원 일곱 명을 뽑는다.
인구가 2만 명 정도인 군은 수두룩하다. 행정효율 때문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행복을 위해서라도 행정구역 개편은 불가피하다. 이제는 시·군 소멸로 겁박하며, 선심성 예산으로 생색내지 말고 행정구역 개편에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