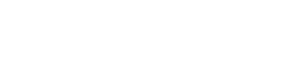“의사로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사람들이 사진가로 불러줄 때가 가장 긍지를 느끼고 또 기분도 훨씬 좋아요.” 내과와 치과의사이면서 지난 60여 년의 세월을 사진과 함께 살아온 사진가 전예근 자문위원(83)은 자신의 사진 인생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했다.
의사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그의 본업이지만 그보다는 뛰어난 감성과 열정으로 사진예술의 길을 걸어온 것이 벌써 반세기를 더 넘긴 60년 세월인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그가 사진가로서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1970년대 한국사진작가협회 충북지부를 만들고 초대 지부장과 4대, 6대 지부장을 맡아 충북 사진계에 사진예술작품창작의 붐을 일으키고 그 저변확대에 그의 애정과 정열을 다 바친 것이다. 그래서 전예근이라는 이름 석 자를 떠올려 치면 때마침 KBS, MBC 라디오와 TV 등에서 의학코너 프로그램의 진행자였던 그를 의사로 보다는 사진가로 알고 지낸 사람이 더 많았다.
이러한 사진 이력을 가진 그의 사진가로서의 시작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였다. 일제에서 광복되기 전인 1940년 일본에 유학 중이었던 그에게 게이오대학생인 큰형이 베스트사이즈 스프링 카메라를 선물해준 것에서부터다.
그는 도쿄에서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사이 시간을 내어 남들의 어깨너머로 사진을 배우면서 장래 사진가로서의 꿈을 조금씩 키워나갔다. 그러다 자신의 사진이 일본 잡지에 표지사진으로 실리자 용기를 얻게 됐고 그 매력에 빠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소록소록 살아나는 열정을 갖게 되었다.
이후 세계 2차대전이 한참 격화되던 1943년 일본에서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그는 귀국하여 서울대 의대에 입학하여 배움의 길을 이어갔다. 대학에서 사진부장을 맡아 활동하면서 공부까지 하느라 어느 하루 쉴 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어느 날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대 졸업식에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박사학위 가운을 입고 참석한 장면을 찍어 발표하여 학교 안팎으로 화제가 되었었죠.”
그의 서울대 치대 학생 시절 함께 지낸 동기생들은 한때 인기 연예인으로 명성을 날렸던 고 길옥윤(작곡가)과 박암(영화배우)이었는데 이들이 모두 예술의 꿈과 재질을 열렬하게 발산하기 시작한 치과생들이었다.
그는 사진을 찍는 것에서 나아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이것이 군에 입대하자마자 글쓰기를 시작한 것이다.
당시 3년이나 계속되었던 6·25 동란이 끝나던 1953년부터 전남 여수육군병원에 근무하면서부터는 제법 글솜씨가 늘어나 195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시부문에 `사이도 좋다'로 당선되는 영광을 차지했다.
이때는 잠시 사진보다 오히려 문학에 흠뻑 빠져 `한국아동문학전집'과 `소년소녀 한국의 문학'등에 연이어 작품을 발표하여 주위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진정한 특기는 사진에 있었다.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 다시 사진을 찍어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가다듬어 사진의 길로 이내 돌아섰다.
이때부터는 정이 흐르는 삶의 따스함이 깃든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티없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들을 진솔하게 필름에 담아내어 어린이 걸작 사진의 진가를 보여주려 노력했다.
우리나라 광고사진이 처음 생겨난 1958년에서 2년이 지난 1960년 그의 가족들을 모델로 하여 삼일제약의 `에비오제' 광고 사진을 찍어 신문과 잡지에 게재되었고 이로 해서 정이 많은 사진가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세상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심성을 지닌 어린 아이들을 찍는 것은 곧 나 자신이 똑같이 동심의 세계에 같이 어울린 감성에 빠져들지요.”